“잃어버린 30년” 대한민국버전?
그때 그 일본, 지금 이 한국… 너무 닮았다
“혹시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거 아냐?”
요즘 경제 얘기 나오면 자주 들리는 말이죠. 그냥 기분 탓일까요? 아니면 진짜 ‘잃어버린 30년’ 대한민국 버전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걸까요?
그래서 오늘은 1990년대 일본과 2020년대 대한민국,
이 둘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비교해보려 합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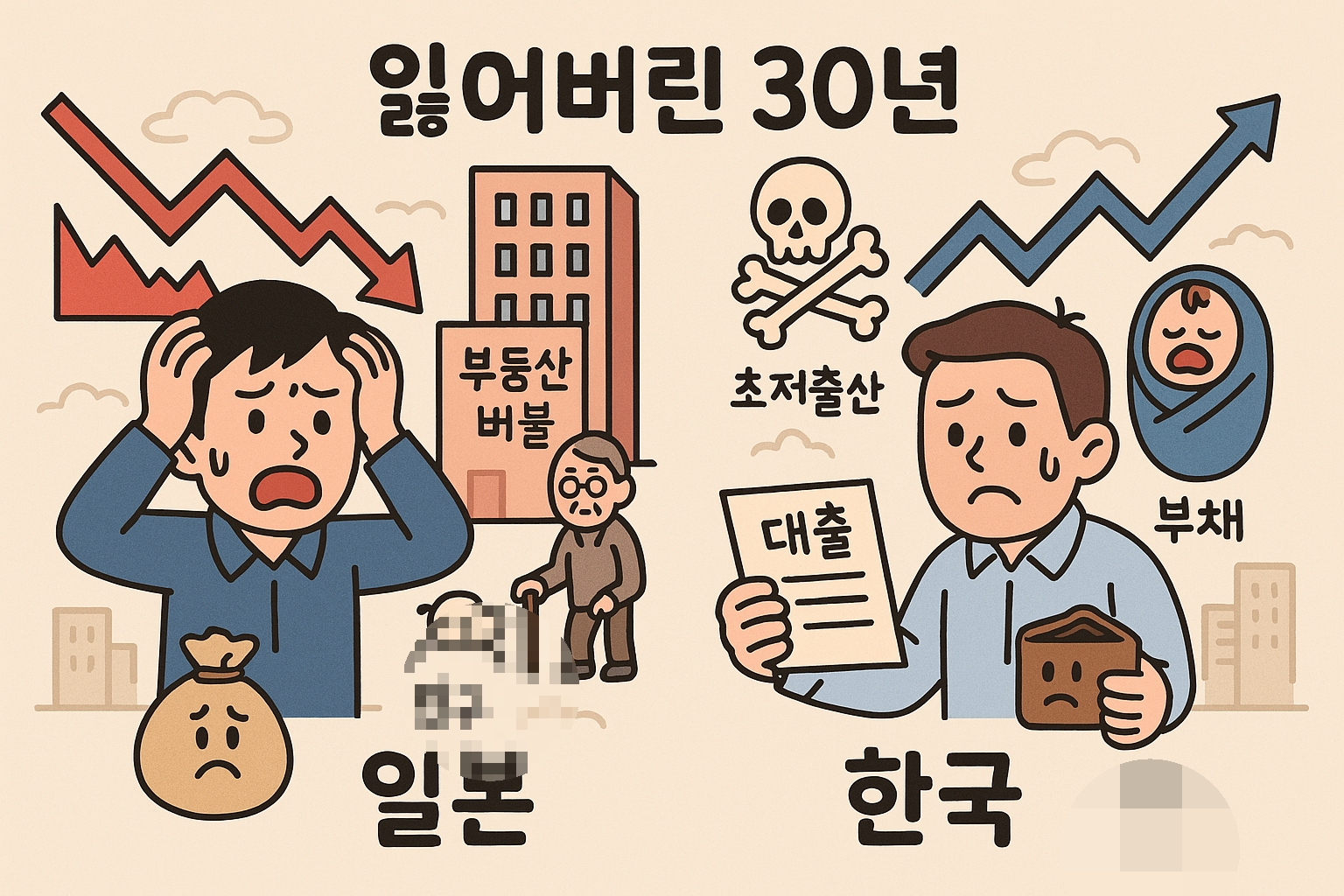
1. 부동산 버블… 어디서 본 듯한 장면
ㆍ일본 1980년대:
“도쿄 땅값이면 미국 전역을 산다”는 말이 있었어요.
건물 하나 팔아서 은행 차리고, 땅 팔아서 재벌 되는 게 가능했던 시절. 결국 1991년 거품이 ‘퐁’ 터졌죠.
ㆍ한국 2020년대:
“집 안 사면 바보”라는 말이 당연했던 지난 몇 년.
영끌·패닉바잉·부린이… 익숙한 단어들이죠?
서울 아파트 값이 연봉 20년 모아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. 지금은 금리가 오르며 그 거품이 ‘서서히’ 빠지고 있죠.
공통점:
집값 폭등 → 대출 급증 → 심리 과열
“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”라는 불안감
그리고… 그 뒤엔 항상 버블 붕괴가 있음
2. 인구 구조의 경고음
ㆍ일본:
1990년대 들어 출산율 저하 + 고령화. 젊은 인구가 줄면서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었고, 생산력도 급감.
ㆍ한국:
세계 최저 출산율, 그리고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.
벌써 생산인구가 줄기 시작했고, 초저출산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.
공통점:
ㆍ경제의 핵심 엔진인 ‘젊은 세대’가 사라짐
ㆍ소비도 줄고, 집도 덜 사고, 기업도 덜 투자함
ㆍ나라 전체가 느릿느릿… 침체의 길로?
3. 민간 부채, 이건 좀 위험하다
ㆍ일본:
부동산 투자 열풍에 기업들도 빚내서 땅 사고 건물 사고. 거품 꺼지자 그 빚들이 다 부실로 변함. 은행도, 기업도 줄줄이 휘청.
ㆍ한국:
2030도 4050도, 심지어 60대도 대출로 집을 샀어요.
가계부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.
이자만 갚느라 허덕이는 ‘이자노예’가 늘고 있죠.
공통점:
부동산 신화 → 빚내서 투자 → 거품 꺼지면 ‘부채 폭탄’
결국 소비 여력 ↓, 경제 순환도 ↓

4. 경제 정책, 타이밍이 생명인데…
ㆍ일본:
거품 꺼진 뒤 정부는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고, 대응도 우왕좌왕. 결국 회복 타이밍 놓침.
ㆍ한국:
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를 강화하고, 금리도 빠르게 인상. 하지만 일부는 “이미 거품 꺼지는 와중인데 너무 강하게 누른다”는 비판도.
공통점:
타이밍 놓치면 ‘악순환’에 빠짐
정책 신뢰 ↓, 시장 불안 ↑
그런데 진짜 우리도 ‘잃어버린 30년’ 겪게 될까?
이건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니에요.
다만 지금 우리가 일본과 비슷한 ‘초입’에 서 있다는 건 분명하죠.
다른 점도 있어요.
한국은 아직 기술, 반도체,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동력이 있음
일본보다 유연하고 빠른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음
국민의 정보 접근력과 행동 속도도 훨씬 빠름
하지만…
그 강점을 살리지 못한다면?
우리가 일본과 같은 길을 가는 데엔, 단 10년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.
경제는 사이클이고, 위기는 반복되죠.
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.
‘잃어버린 30년’이 되느냐,
‘새로운 30년’을 시작하느냐는
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